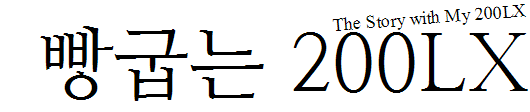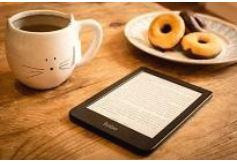<프롤로그 > 빵굽는 타자기와 빵굽는 200LX
빵굽는200LX 2013. 1. 29. 15:14 |폴 오스터라는 작가가 쓴 <빵굽는 타자기>라는 책이 있다. 작가의 힘겨웠던 젊은 시절을 담고 있는 자전적 소설이라고 한다.
타자기로 빵을 굽다니?
제목이 참으로 요상했다. 왠지모를 호기심에 이 책을 구입했다. 아울러, 이 책의 저자인 폴 오스터가 자신의 글쓰기 도구로 사용한 타자기에 대해 쓴 책인 <타자기를 치켜세움, The Story of My Typewriter>라는 책도 함께 구입했다. 그리고, <타자기를 치켜세움> 이라는 책을 먼저 읽어보았다.
책의 내용은 특별할 것이 없고, 오히려 그림책이라고 불러도 될만큼 내용에 있어서는 부담이 없다. <빵굽는 타자기> 라는 책 제목의 빵과 타자기 사이에는 딱히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1
[ 빵을 굽는 것은 타자기가 아니라 토스트기인데... ]
아직 읽어보진 않았지만, 무엇인가 은유적 표현이 아닐까? 라는 예상을 해보며 짐작컨데,
1) 빵은 음식, 즉, 타자기는 작가 자신의 생계수단
2) 빵 굽는 냄새는 사람을 기분좋게 한다. 타자기의 아날로그적 감성을 빵을 굽는 느낌으로 표현한 것은 아닐까?
이 책의 작가인 폴 오스터는
자신의 모든 글들을 「올림피아(Olympia)」라는 낡은 중고 타자기를 통해 썼다고 하는데,
타자기를 사용한지 처음 10여년의 기간동안은 자신의 타자기에 특별한 애착이 들진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어느 순간 저자는 그의 타자기의 소중함에 눈을 뜨고 그가 소유한 올림피아 타자기에 특별한 애착을 갖게 된다.
그에게 있어 글쓰는 도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타자기...
하지만, 그는 인생의 후반기에 자신이 사용해온 타자기에 인생의 소중한 동반자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빵굽는 타자기(원제:The story of my typewriter)의 표지그림]
나에게 내 손에 들어온지 10년 가까이 되는 특별한 기기가 하나 있다. 나 역시 폴 오스터 처럼 새 것이 아닌 중고로 구한 것이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 기기를 접할 수 있는 중고시장이 꽤 활성화 되어있었기 때문에 상태가 꽤 좋은 중고품을 구할 수 있었다. 뒷면 시리얼 넘버로 미루어 짐작할 때, 이 녀석은 1994년에 태어났다. SG로 시작되는 8자리 일종의 일련번호다.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것이 아닐까? 이 녀석은 출생 후 8년쯤 후에 인연이 닿아서 내 손에 들어왔다. 나름대로 애지중지했지만, 사용하다보니, 오른쪽 힌지에 살짝 금이 가고, 액정 힌지의 고정력이 떨어져 헐거워졌으며, 키보드는 사용감이 묻어나고, 뒷면 전지배터리 덥개의 고정핀이 부러졌지만 그래도 내게는 매우 소중한 기기이다.
이 기기의 정식 이름은 HP 200LX라고 한다. (HP는 설립자들인 휴렛-팩커드의 이니셜을 딴 브랜드 이름)
유감스럽게도 세상은 더이상 HP 200LX를 잘 기억하지 못한다. 그들에게 익숙한 것은 이제 200LX가 아닌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이다.
실제로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처음 출현했을때, 온 세상의 대중매체가 떠들석했지만, 내 눈에는 그리 신기하게 다가오지 않았다. 왜냐하면,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제공하는 가치(Value)가 내게는 너무나 익숙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아마도 2000년대 초반부터 PDA라는 것을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다.
[짜잔! 내가 너희에게 아이패드를 하사하노라!]
나는 2000년 즈음에 국내의 어느 중소기업이 만든 <셀빅>이라는 PDA를 처음 접한 후 부터, 2002년말까지 <zessplus>, HP의 <조나다548>, 삼성의 <이지프로(izzipro)>등과 같이 여러 종류의 PDA를 사용해보았고,
2002년 말에는 매끈한 자태의 PDA인 아이팩 포켓피씨(iPaq PocketPC)라는 제품의 구매를 고려하고 있었다. 그런데, 제품 사용후기들을 살펴보는 도중에 우연히 200LX라는 기기의 존재에 대해 알게 되었다. 도스(DOS)를 기반으로 하는 PDA라는 사실이 내 호기심을 크게 자극했다.
결국, 연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최신품 PDA인 아이팩 포켓피씨와 중고품 200LX를 모두 손에 넣게 되었다.
내가 실사용을 목적으로 구매한 아이팩 포켓피씨(iPaq Pocket PC)는 그해 생산된 따끈따끈한 신제품이었다.
내가 호기심에 중고로 구매한 200LX는 94년에 생산되었으나 단종되었고, 그 후 8년이라는 한참의 세월이 지난 어찌보면 한물간 구식 물건이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사용해보고 200LX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성능, 편리함, 유저 인터페이스와 완성도 등에 있어서 200LX가 포켓피씨보다 더 훌륭한 기기였기 때문이다. 200LX는 단순한 PDA의 범주를 넘어서는 기기였다.2 당시 한물간 중고물건 200LX가 2002년판 최신기종 포켓피씨(PocketPC)보다 훨씬 뛰어난 도구라는 것을 파악한 다음 200LX 이외에 내가 보유한 PDA들은 대부분 처분되었다. 이후 200LX의 스케쥴러인 Appointment와 메모 프로그램인 Note Taker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장기간 매우 편리하고 유용하게 사용하였다.
시간이 흘러흘러...
바야흐로 2010년 스마트라는 용어가 붙은 기기들이 대세가 되는 세상이 왔다.
나 역시 시류에 뒤떨어지는 것이 싫어서 아이패드 사용자 행렬에 동참하게 되었다. 나의 200LX는 아이패드에 밀려 서랍속에서 동면할 수 밖에 없는 운명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확실히 아이패드는 해상도 높은 디스플레이, 고성능 CPU, 보급률 높은 무선 네트워크, 생태계로서의 앱스토어, 충전후 장시간의 멀티미디어 콘텐츠 사용이 가능한 배터리 등과 같은 여러 주변 기술들3의 뒷받침을 받는 강력하고 매력적인 기기이다.
[HP 200LX, 1994년 출시]
사용자 가치 측면에서 보더라도, 아이패드는 MP3, PDA, 노트북, PMP, 전자책 등의 여러 기기들이 제공해오던 다양한 가치를 잘 버무려 통합하여 유저에게 매우 유용한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 한마디로 아주 정교하게 잘 만들어진 기기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2010년 말부터 지금까지 아이패드를 늘 가까이에 두고 애용해왔다. 속된 말로 헤비유저(heavy user)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잘 만들어진 아이패드를 만족스럽게 사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왠지 모를 갑갑함을 느껴왔다.4 특히나, 아이패드에서 사용가능한 스프레드쉬트를 찾다가 나의 기대수준을 충족시켜주는 앱을 찾지 못하면서 아주 우연히 충동적이면서 돌발적으로 서랍 속에서 동면중이던 200LX를 다시 꺼내 들게 되었다.
200LX에게 알카라인 건전지 2개를 끼워주자마자, 녀석은 서랍 속으로 들어가지 직전의 바로 그때 그 마지막 모습으로 변함없이 정상작동 하였다.
긴 잠에서 깨어난 200LX는 정신을 차리자,
삑... 삑... 소리를 내며 백업배터리인 CR2032 전지를 새 것으로 교체해달라는 메시지를 내게 전달해주었다.
미사용 파나소닉 CR2032 전지로 교체해주자, 녀석은 거진 2년 반전에 사용되던 그 때 그 모습 그대로 내게 다시 다가왔다.
[ CR2032 바로 요렇게 생겼다. ]
어느덧 200LX가 긴 잠에서 깨어나 서랍 밖 세상으로 다시 나오게 된 지 3주가 지났다.
나는 이제 그동안 아이패드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어색함과 갑갑함의 실체가 무엇인지 확실히 파악했다.
나는
아이패드를 2년 넘게 사용하고 나서 비로소
200LX가 제공하는 핵심 가치는
아이패드의 그것보다 더 뛰어난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된다.
무엇이 어떤 면에서 더 뛰어난 것인지를 콕 집어 구체적이면서 명쾌히 설명해 낼 수 있을 정도로 말이다.
아이패드의 가치가 뛰어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200LX의 그것이 더 뛰어나다는 말이다.
200LX를 다시 사용하는 순간 왠지 막혔던 곳이 뻥뚫리는 듯한 해소감과 더불어
200LX 특유의 경박단소하면서 심플하면서 다재다능하면서 동시에 강력한 기능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 <아! 바로 이것이었구나!>
3주동안 손 가까이에 놓고 사용했지만, 배터리가 아직 남았다. 200LX가 참 기특하게 느껴진다.
쓰면 쓸수록 부담이 없고 편안하다. 이제 이 기기는 없어서는 안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애정이 생긴다.
문득, 나는 한낯 타자기에게 단순한 친구 이상의 감정을 느꼈던 <빵굽는 타자기>의 저자 폴 오스틴의 심정에 공감하기 시작했다. 200LX를 펼치면 빵굽는 냄새가 전해져오는 것 같다. 확실히 나는 폴 오스틴이 그랬던 것 처럼 200LX 로부터 예전엔 느끼지 못했던 <빵굽는 200LX>의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빵굽는 냄새는 구수한 냄새다. 빵을 갓구워내는 빵집 옆을 지나갈때면 무의식적으로 냄새를 더 음미하게 하는 사람을 기분좋게 하는 그러한 냄새다.
200LX가 지니고 있는 생산성 도구로서의 핵심가치가 얼마나 멋지고 훌륭한 것인지,
나는 앞으로 기회가 될때 200LX의 그 구수한 빵냄새를 하나하나 차근히 풀어놓을 생각을 해본다.
- 영문제목은 Hand to mouth라고 한다. 아마 빵굽는 타자기라는 제목은 번역가가 원서를 번역하면서 책 내용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번역서의 제목으로 선정해서 붙인 것이 아닐까란 짐작을 해본다. [본문으로]
- 실제로 제조사인 HP는 200LX에 PDA라는 이름 대신에 팜탑 피씨(Palmtop PC)라는 이름을 부여했다. 랩탑 피씨가 무릎위에 올려놓고 사용하는 컴퓨터라는 의미를 가진 것처럼, 팜탑이란 손바닥위에 올려놓고 사용하는 컴퓨터라는 의미이다. 아이팩의 경우,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는 PC의 의미를 가진 포켓피씨(PocketPC)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사실 아이팩의 성능은 PC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는 민망한 것이다. PDA의 범주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기기라고나 할까? 하지만, 200LX는 PC라는 이름이 전혀 부끄럽지 않은 그 자체로 완전한 PC라고 보면 된다. PDA라는 범주에 억지로 가둬놓을 수 없는 제품이며, 팜탑이라는 이름이 오히려 더 적절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다. [본문으로]
- 캐즘 마케팅(Crossing the chasm)의 저자인 조프리 무어(Geoffrey A. Moore)는 그의 저서에서 완전제품(The Whole Product - 얼리어답터 계층이 아닌 대중시장의 실용주의 계층이 요구하는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제품)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완전제품을 위해선 그 핵심 가치를 뒷받침해주는 주변 가능 기술(Enabling Technology)의 존재가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이패드에 대한 글에서 나중에 다시 별도로 언급할 일이 있을 것 같다. [본문으로]
- 아이패드 사용경험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해야할 것 같다. [본문으로]
'빵굽는200LX' 카테고리의 다른 글
| HP 100LX "쿠거(Cougar)"의 개발과정 (HP 200LX) (0) | 2013.02.15 |
|---|---|
| HP 엔지니어가 말하는 95LX의 제품 개발 과정 (200LX) (0) | 2013.02.14 |
| 200LX vs 아이패드 - (2) 200LX의 핵심가치 (0) | 2013.02.06 |
| 200LX vs 아이패드 - (1) 아이패드의 핵심가치 (0) | 2013.02.04 |
| LX 시리즈 설명 (from HP 컴퓨터 박물관) (0) | 2013.02.02 |